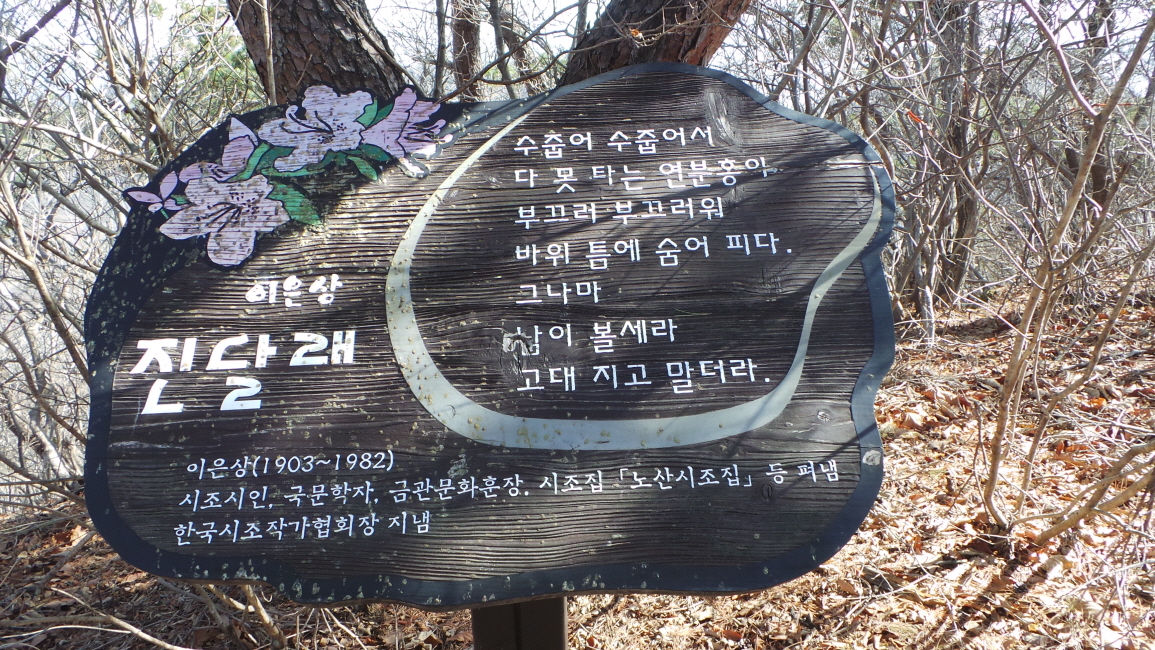경상남도
김해 백두산, 장척산, 신어산, 돛대산
꼴통 도요새
2022. 3. 7. 11:39
김해 백두산, 장척산, 신어산, 돛대산


1. 산행지: 백두산(白頭山, 354m), 장척산(531m), 신어산(神魚山, 634m), 돛대산(380m)
2. 위치: 경남 김해시 상동면·삼방동·대동면
3. 일시: 2022년 3월 5일(토)
4. 날씨: 흐리고 춥고 강한 찬바람
5. 누구랑: 나 홀로
6.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7시간 51분/ 19.36km
7. 들머리/ 날머리: 대동면 예안리 고분군[출발/ 도착]
8. 산행코스: 예안리고분군→시례마을(대동먹거리 표시판)→원명사→백두산 누리길 이정판→백두산(정자)→육형제소나무(정골마루쉼터)→선무봉(470m)→장척산→생명고개→315계단→신어산 동봉→신어산→선암다리 방향→편백나무숲→돛대산→원동마을표지석→성안마을회관→시례마을 표지석→예안리고분군
9. 특징:
백두산
경남 김해시의 대동면 예안리·괴정리·초정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고도 : 354m). 북서쪽의 신어산에서 산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북쪽으로는 동신어산, 남동쪽으로 백두산으로 이어진다. 낙동강가에 위치하며 산 동쪽으로 부산~대구 고속도로, 69번 지방도 등이 지나며 동쪽사면에 월명사가 있다. 『조선지지자료』(김해)에 하동면(현재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산으로 백두산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백두산의 이칭으로 방산(舫山)을 수록하였다. 백두산 지명과 관련해 대홍수 때 산이 100마(碼) 정도 남아 유래했다는 설, 산경표 상의 끝점인 백두산에 대칭되는 시작점이 되는 산이라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 등이 있다.
신어산
금관가야(金官伽倻) 시조 수로왕과 허황옥(許黃玉) 왕비의 신화가 어린 성산(聖山)이다. 신어는 수로왕릉 정면에 새겨진 두 마리 물고기를 뜻하며 밀양 만어산(萬魚山:670m) 전설에도 나오는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과 가락국(駕洛國)의 상징이다. 일명 선어산(仙魚山)이라 하며, 동신어산은 동쪽 신어산의 와전이다. 이 산을 핵으로 시 복판의 황새봉(393m)·경운산(慶雲山:379m)·분성산(盆城山:375m)이 동쪽 백두산(白頭山:352m)·덕산(德山:457m)·까치산(342m) 등과 연봉을 이루고 낙동강 건너 소백산맥의 산들과 대치하고 있다. 카펫처럼 부드러운 백두산∼신어산 종주능선은 부산 근교의 워킹 산행지이다. 산마루에 서면 부산을 에워싼 연봉들의 능선을 조망할 수 있다. 금정산(金井山:801m)과 태백산맥의 구봉산(九峰山)에서 몰운대(沒雲臺)로 뻗은 낙동정맥(洛東正脈)의 산군은 물론, 지리산 영신봉(靈神峰:1,651m)에서 분성산에 닿는 낙남정맥(洛南正脈)의 연산들을 비롯해 이웃한 무척산(無隻山:703m), 양산시 물금읍 오봉산과 원동면 토곡산(土谷山:855m), 웅상읍 원효산(元曉山:992m)과 천성산(千聖山:812m) 등 동부의 크고 작은 산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가야의 올림포스산답게 초기의 고찰 은하사(銀河寺)와 영귀암(靈龜庵) 등이 있으며 기우단도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구암사(龜岩寺)·십선사(十善寺)·청량사(淸凉寺)·이세사(離世寺)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산은 불모산(佛母山:801m)의 신화와 함께 남방불교 전래의 성지라 할 수 있다. 대동면 초정리 원명사에서 출발, 약수터와 백두산, 510봉 감천재로 종주하고 상동면 대감리 고암마을로 내려오며 7시간쯤 걸린다. 신어천이 낙동강으로 흐르는 경관 속에 삼림욕장 등을 갖춘 종합레저시설 가야랜드와 골프장이 인근 도시민들의 주말 휴양지로 인기다. 경부선·경전선·남해고속도로 등이 통과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예안리고분군(禮安里古墳群)
사적 제261호. 1976년 국립박물관에서 일부지역을 발굴조사해 돌덧널무덤[石槨墓]·덧널무덤[木槨墓]·독무덤[甕棺墓] 등 32기의 무덤을 발견했고 이어서 1979년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그결과 덧널무덤 59기, 돌덧널무덤 93기, 돌방무덤[石室墳] 13기, 독무덤 17기 등 모두 182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4~7세기에 걸쳐 있으며,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의 무덤도 섞여 있다. 무덤들의 시기는 대략 3단계로 나뉜다. 1기에는 덧널무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돌널계 돌덧널무덤[石棺系石槨墓]도 일부 사용되고 구덩식장방형돌방무덤[竪穴式長方形石室墳]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4세기에 해당되며 토기출토상황으로 보면 와질토기(瓦質土器)와 도질토기(陶質土器)가 공존하다가 후자가 점차 유행하는 시기이다. 2기에 접어들면 덧널무덤이 급격히 쇠퇴하고 구덩식돌방무덤이 주로 사용되며 이와 함께 배장된 소아용의 독무덤도 발견된다. 이 시기는 6세기 중반을 하한으로 하며, 이 기간중에 신라토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이 신라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3기는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墳]이 유행한 시기로서 굽이 짧은 굽다리접시[短脚高杯]와 부가구연(附加口緣)의 목단지[長頸壺] 등 통일신라 양식의 토기가 나타난다. 이 유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수의 인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한 무덤에서 다수의 인골이 발견된 경우도 많은데, 이는 추가장(追加葬)이 행해진 결과이다. 1976년 발굴에서 125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되어 형질인류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성별이 판명된 개체 가운데 남성이 33인분, 여성이 30인분으로 거의 같은 비율이며, 유아·소아의 것이 31인분에 달하여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 유아·소아의 사망률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독무덤에 묻힌 자들은 거의 2~3세 미만의 어린아이였음도 밝혀졌다. 한편 85호분에서 발견된 여성 인골에서는 인위적으로 두개골을 변형시킨 편두(扁頭)의 흔적이 엿보여 진한·변한 지역에 편두의 풍습이 있었다는 〈삼국지〉의 기사와 부합한다.
우리산줄기이야기
낙남정맥은 조선시대 조상들이 인식하던 한반도의 산줄기체계는 하나의 대간(大幹)과 하나의 정간(正幹), 정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된 이들 맥은 10대강의 유역을 가름하는 분수산맥을 기본으로 삼고 있어 대부분의 산맥 이름이 강 이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낙남정맥은 낙동강 남쪽에 위치한 정맥으로,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白頭大幹)이 끝나는 지리산의 영신봉에서 동남쪽으로 흘러, 북쪽으로 남강의 진주와 남쪽의 하동·사천 사이로 이어져, 동쪽으로 마산·창원 등지의 높이 300∼800m의 높고 낮은 산으로 연결되어 김해의 분성산(360m)에서 끝난다. 서쪽에서는 섬진강 하류와 남강 상류를 가르고, 동쪽에서는 낙동강 남쪽의 분수령산맥이 된다. 연결되는 산은 옥녀산(玉女山, 614m)·천금산(千金山)·무량산(無量山, 579m)·여항산(餘航山, 744m)·광로산(匡盧山, 720m)·구룡산(九龍山, 434m)·불모산(佛母山, 802m) 등으로 그 길이는 약 200km이다.[출처 다음백과]
산행후기
오늘은 김해 신어산을 중심으로 주변 산군들과 엮어 함께 탐방하였다. 이 산들은 각각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들이었지만 필자는 함께 엮어 탐방하였는데, 마지막 돛대산은 원점회귀를 하려다보니 마지막 날머리에서 길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산의 이름은 산행 도중 이정목에 어느 개인이 적어 놓은 듯한 선무봉, 시례북산 등은 확인할 길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행로는 모두 뚜렷하였고 이정표와 등산안내도 등등 모두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 비록 코스는 길었지만 대부분의 길들이 좋아서 편히 탐방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